... 어쩌다 여기까지?
내 글은 나에게 언제까지나 무해한가, 본문
브런치는 다음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플랫폼이다. 티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글쓰기와 출판이 목적이라는 데서 출발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카카오, 브런치를 모두 가진 이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브런치를 소개하고 브런치의 글을 다음 포털에 올리는 식으로 자신들의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어제, 28일, 나의 브런치 북 <내 이름은 김딸공>이 카카오 채널의 브런치 레터로 소개가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같은 날 나의 다른 글 <서울대 합격증을 내다 버리며>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소개가 되었다. 완전히 맥이 다른 두 글이 같은 날 다른 방식으로 소개된 것이다. 브런치의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자극적인 제목을 좋아하는 건 확실하군, 정도의 자체적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 허세를 부리며 “브런치가 뭐길래”를 올렸다.
<브런치가 뭐길래> https://ddalgong.tistory.com/880
그런데 ‘조금’ 올라갈 거라 생각했던 구독자 수는 하루만에 90명에서 260명이 되었고,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이 어그로를 끌었나, <서울대 합격증을 내다 버리며>는 조회수 10만을 돌파해 버렸다. 나는 더욱 브런치와 포털의 힘이 두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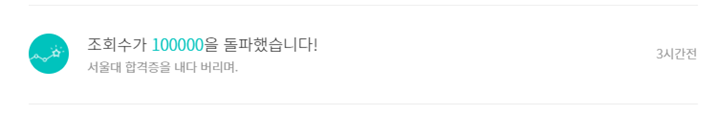
내가 사랑하는 작가 이슬아의 문집 <일간 이슬아>에는 지인들이 쓴 추천사가 가득 담겨있다. 이슬아 작가와 그녀의 글을 향한 애정이 담뿍 느껴지는 어느 추천사에서 그녀의 지인은 이런 말을 했다. ‘그녀가 남긴 매일의 기록이 그녀에게 되돌아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에 고단한 용기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진심 어린 기원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추천사를 남길 수 있는 지인을 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를 멈추지 않는 그녀의 용기도 새삼 부럽다.
지금까지 나는 내 글이 독자에게 매력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내 글이 미래의 나에게 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겨우 브런치에 한두 줄 글을 남긴 기록에 이런 고민을 하다니, 장래희망 수십가지 중 하나였던 글쟁이 할머니는 이제 그만 지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발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